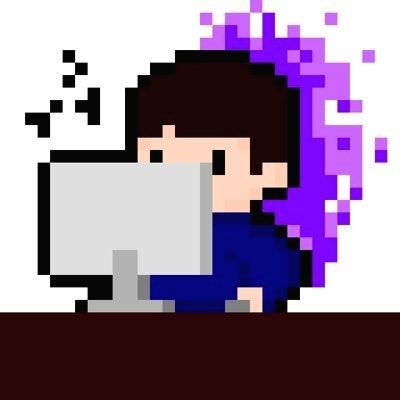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 유희열의 스케치북
- Grammy
- Whitney Houston
- 북프리뷰
- 푸코
- 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 Althusser
- 그린비
- 윤희에게
- 니체
- 들뢰즈
- 페미니즘
- 북리뷰
- Medley
- 섹슈얼리티
- 김연수
- 정신분석학
- 화장품
- 라캉
- Live
- Judith Butler
- 발췌독
- ISA
- Adele
- 권여선
- 이상문학상
- Beyonce
- Celine Dion
- I Will Always Love You
- 이소라
- Today
- Total
Acknowledgement
사랑의 불안: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 리뷰 본문

〈자이툰 파스타〉나 〈대도시의 사랑법〉 같은 퀴어 소설 작품집을 의무감으로 챙겨보곤 했다. 단편소설집이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진다고 들었을 때도 좀 시큰둥했는데 극우 도덕주의 성보수주의 일파의 불링과 그에 응하는 주연 배우들의 올곧은 태도 덕분에 좀 흥미가 생겼고 대충 사흘에 걸쳐서 8편으로 된 4개의 이야기를 몰아 봤다. 소설을 먼저 읽고 영상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소설만큼 만족스럽기가 쉽지 않은데, 원작에서 중요한 부분은 잘 지키고 원작에서 에둘러 간 부분들에는 조금 더 명확한 연출들, 감독, 작가, 배우가 각자의 해석을 덧대면서 퍽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소설보다 드라마 쪽이 좋았다. 영화는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고영(남윤수 분)은 남겨지거나 남기로 결정한다. 그를 움직이게 하는 건 항상 사랑인데, 그는 항상 조금 뒤에 그 사실을 깨닫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랑이 그에게 도착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그는 자신이 사랑에 둘러 싸이는 결말을 두려워한다.
이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고영의 성장담이고 각 부는 정확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시간의 흐름을 타고 이어진다. 1부 '미애'에서 작가로 데뷔하기까지 대학생, 2부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에서 작가로 작품 몇 개를 발표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신인 작가, 3부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취업에 성공해 주말에 글을 쓰는 투잡러 청년, 4부 '늦은 우기의 바캉스'에서는 대략 30대 초반은 되었음직한 시점에서 국제적인 상을 받은 작가로서의 고영'들'을 다룬다. 이 고영'들'은 같은 캐릭터라고 읽지 않아도 무방하다. 고영은 한국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게이 중 일부 집단에서 쉽게 나타날 법한 전형을 다수 갖추고 있고 작가라는 특징 역시 영상이라는 매체에 특성상 원작 소설에 비해 덜 드러나기 때문에 4부에서 작가로 자리 잡은 이야기를 직업적으로 인정받는 일로 바꿔 읽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어쩌면 조금 더 대중적인 이야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1부의 고영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애정 공세 역시 견디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 클럽, 섹스를 자주 찾는다. 2부의 고영은 아픈 어머니를 돌보고 사회의 시선을 의식한다. 3부의 고영은 연애와 정착을 고민한다. 4부의 고영은 과거를 뒤적인다. 이 과정에서 여러 남자들이 등장하고 고영은 어떤 연인을 지겨워 하기도, 다른 연인에 집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타이틀은 우리에게 묻는다. 고영은 이들을 사랑했을까? 사랑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서울은 그 사랑에 어떻게 끼어드는가?
사랑은 여러 환영과 이미지들을 아우르는 개념이고 원론적으로 그것을 정의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무가치하거니와 재미도 없다. 이 드라마에서도 사랑이 무엇일지를 묻는 멍청한 장면은 없다. 다만, 고영은 항상 자기에게 있었던 것,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잃는 순간에 자신과 그 대상의 관계에 사랑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타인에게 듣거나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된다.

예컨대 남규(권혁 분)가 죽었을 때 고영은 자신이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안 되어 도망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한다. 모친 은숙(오현경 분) 죽고 유산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가까웠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머니가 '사랑이 많은 분'이었다는 말을 듣는다. 클로짓 게이인 영수(나현우 분)가 결국 고영을 거부할 때에 고영은 '너 설마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어?'라는 말을 듣는다. 규호(진호은 분)와 사귀고 권태기가 찾아올 때 그리고 헤어지고 일본인 남성 하비비(김원중 분)을 만날 때에는 자신이 사랑은 했었는지, 사랑을 할 줄은 아는지 자문한다. 이 모든 되돌아보기의 순간은 사랑의 대상이 그 자리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이뤄진다. 예컨대 그가 남규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남규에게 그 일은 항상 내일 일어난다. 내일이 되면 다시 내일로 미뤄지는 미래 시제의 사랑—그것이 고영이 서울에서 배운 남자를 사랑하는 법이다.
이 드라마는 어쩌면 원작보다 더 서울의 게이 씬에 밀착되어 있다. 실존하는 게이 클럽이 등장하고 인물의 말투와 제스처 등에서 '실제' 게이를 모사하려는 노력이 뚜렷하게 읽힌다. 고영이 HIV 감염인이라는 묘사 역시 이 재현의 '무게'를 더한다. 아주 확실하진 않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중반 정도의 게이 씬이 떠오른다. 2024년의 이태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게이 커뮤니티에서 어떤 것들은 아주 느리게만 변한다. 이 드라마와 실존하는 게이 씬과의 가까움은 고영을 여러 가지 게이의 모습 중 하나의 계열을 건져내어 재구성한 전형처럼 느껴지게 한다. 예컨대 고영의 절친한 게이 친구 은수는 오래 사귄 애인이 있지만 극의 에필로그 시점에서는 다시 솔로가 된 상태다. 되돌아 봄으로써 짜맞춰지는 사랑의 방법은 고영의 특수한 성격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서울을 사는 게이들이 공감할 만한 습관일 수 있다. 대도시—거기에는 모든 것이 많지만 내것은 없다. 아름다운 불빛으로 수놓아져 있지만 멀리서 볼 때에만 그 광경을 눈에 담을 수 있다 (마치 남규가 그를 불빛이 적은 산으로 데리고 갔을 때에만 야경을 또렷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삶이 그곳을 스쳐 가지만 무엇도 거기에 온전히 속하지는 못한다. 대도시에서의 사랑은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존재하고 공간적으로는 발을 붙일 데가 없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볼 때 항상 부유하고 희뿌연 연기다.
도시의 성소수자 남성에게서 이런 형태의 사랑만이 가능하거나 적어도 흔한 일이라면 거기에는 분명 사회문화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 드라마도 (그리고 대부분의 시청자들도) 그런 고민으로 향하지는 않는다. 사실 영은 점점 더 많은 자원을 갖게 되고 에필로그에 이르러서는 그가 스스로 느끼는 공허함을 제외하면 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충족된 삶을 산다.
사랑을 배회하는 실존적 불안 따위를 공감 가능한 형태로 재현하고 쉽게 답할 수 없는 일에 겸허히 입을 다묾으로써 문제의 난해함을 전달하려고 한다. 만족스러운 섹스도, 돈이나 명예도, 순진한 애정도, 사려 깊은 이해와 위로마저 사랑의 불안을 멈출 수 없다면 무엇에 기댈 수 있을까? 에필로그의 '불꽃'은 여전히 멀리 있기에 아름답다. 그리고 계속 살아가기를 권유한다. 이 거리두기의 아름다움을 행하는 이들이 고영의 절친들이다. 고영의 절친들은 그가 일주일쯤 연락이 없자 그의 자취방에 처들어가서 그의 생사를 확인한다. 그들은 서로 자지 않는다. 혹은 자더라도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고 친구로 남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을 대할 때, 혹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할 때 사랑을 불안해 하는 사람이 참고할 만한 전략이다. 소중한 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끝까지 모른 척하자.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문제를 아주 조심스럽게 감싸 뒤로 밀어내자.

밀어둔 문제는 언젠가 터질 것이고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때가 어김없이 올 것이다. 그때도 삶에 반짝거리는 것이 남아 있어서 그를 그가 살아 왔던 방식으로 되돌려 보낼 힘을 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반짝거리는 것이 어두워질 때부터, 사랑이란 두루뭉술한 대상에 홀리지 않을 수 있게 될 때부터, 자기를 미래에 두기를 포기할 때부터 시작되는 삶도 있다. 영이 부유한 일본인 연인을 애써 떠날 때처럼 달라진 나를 기대하는 용기 있고 당찬 모습이 아니라 같이 고기를 굽는 친구들과 실없는 농담을 주고 받고 기쁘거나 슬플 때 서로를 끌어 안을 때 나오는, 기대와 관련이 없는 가벼운 웃음에 묻어 있는, 사랑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방식처럼.
'쓰기 > 쓰기_영화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기 욕망으로부터 도망치고 또다시 껴안기: 괴물(2023) 리뷰 (0) | 2024.01.02 |
|---|---|
| 영화 단상 - 애프터양, 쥐는 치즈 꿈, 링 원더링, 체리마호 (0) | 2022.07.13 |
| 강박, 질투, 의심, 혹은 한 번 더 애착하기: 〈헤어질 결심〉 리뷰 (0) | 2022.07.06 |
| 브로커 감상/단상 (0) | 2022.06.27 |
| 〈모럴센스〉가 진짜로 실패한 것: 리뷰 (0) | 202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