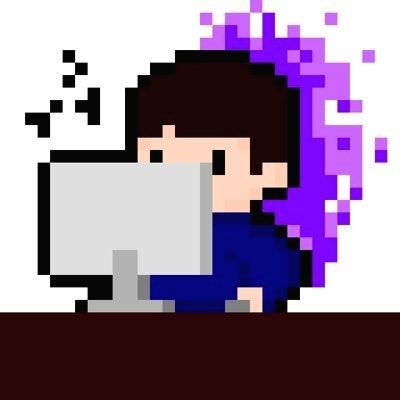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Adele
- 정신분석학
- Medley
- 이상문학상
- Althusser
- 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 이소라
- 북프리뷰
- 북리뷰
- Grammy
- 발췌독
- 들뢰즈
- ISA
- 페미니즘
- 니체
- 유희열의 스케치북
- 김연수
- I Will Always Love You
- 섹슈얼리티
- Live
- Beyonce
- 라캉
- 윤희에게
- 권여선
- 그린비
- Judith Butler
- 푸코
- Celine Dion
- 화장품
- Whitney Houston
- Today
- Total
Acknowledgement
좌파란 무엇일까? 혹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1) 본문
좌파란 무엇일까? 혹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1)
사실 애초에 이 글을 계획했을 때, 나는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키워드』 에서 “좌파”(Left Wing)에 관한 글을 찾아서 옮기고 간단히 내 생각을 더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뭐든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 법. 가장 중요한 “좌파” 항목이 저 문헌에 없던 것이다. 갸악-_-;
하지만 이왕 계획한 것이니만큼 조금 에둘러 가더라도 “좌파”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는 글을 쓰긴 써야겠다 싶었고 『키워드』는 좋은 참고 문헌이 되어 주었다. “좌파”에 대한 사전적인 설명은 위키피디아 영문판을 인용하도록 하겠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사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대략의 유래라든가 개괄은 어떤 사전을 봐도 비슷할 것 같다)
In politics, left-wing describes an outlook or specific position that accepts or supports social equality, often in opposition to social hierarchy and social inequality. It sometimes involves a concern for those in society who are perceived as disadvantaged relative to others and an assumption that there are unjustified inequalities (which right-wing politics views as natural or traditional) that need to be reduced or abolished.
정치학에서, 좌익이란 사회적 평등을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관점이나 특정한 입장을 말하며, 보통 사회적 위계나 사회적 불평등에 반대한다. 이는 때때로 사회에서 다른 이들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감지되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 및 줄어들거나 없어질 필요가 있는 (우익에서는 자연스럽거나 전통적인 것으로 보는) 부당한 불평등을 가정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The political terms Left and Right were coined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1789–1799), referring to the seating arrangement in the Estates General: those who sat on the left generally opposed the monarchy and supported the revolution, including the creation of a republic and secularization, while those on the right were supportive of the traditional institutions of the Old Regime. Use of the term "Left" became more prominent after the restoration of the French monarchy in 1815...
좌/우라는 정치적 용어는 삼부회의 자리 배치를 언급하는 것으로, 프랑스 혁명 시기(1789-1799)에 주조되었다. 군주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개 그의 왼편에 앉았으며
혁명, 공화정의 탄생과 세속화를 지지했다. 반면에 오른편에는 전통적인 구체제의 지지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좌파"라는 용어의 사용은 프랑스 왕정 복고(1815) 이후 더욱 유명해졌다. (...)
여기에 더해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폭넓은 단어 '좌파(the Left)'는 프랑스혁명기에 의회 의석의 우연한 배치에서 유래한 것으로 19세기부터 알려졌지만 일반적인 표현으로 확대된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였다. '좌파주의(leftism)'와 '좌파(leftist)'라는 단어는 1920년대까지 영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43).
의외로 좌파라는 용어가 지금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사실 우리가 '좌파'라고 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들은 있으나 그 이미지가 모두 같지도 않고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면에서 '좌파'는 분명히 논쟁적인 용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난 실제로도 논쟁적인 용어라고 생각한다).
'좌파'라는 용어의 이미지를 떠올릴 만한 몇 가지 사례를 들기 위해 윌리엄스의 책에서 계급(Class)과 이데올로기(Ideology)에 대한 글을 몇 자 옮겨 적는 게 도움이 될 듯하다.
17세기 말 이후, 집단이나 구분을 뜻하는 일반명사 'class'의 용법은 더욱 확대되었다. 당시 아주 곤란했던 문제는 'class'가 일반적인 어의로 식물이나 동물에서처럼 인간에 대해서도 사용되었는데 현실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인 내용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
내가 알기로 계급의 근대적 의미가 처음으로 읽히는 예는 대니얼 디포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이다. "임금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보다 많은 계급들로 나뉘는 것은 명백하다."(《리뷰》, 1705년 4월 14일) 하지만 이것은 경제적 맥락에서의 논의일지라도 그리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
이러한 곡절을 드러낸 중요한 배경이 사회적 분류를 지시하는 또 다른 어휘들의 존재이다 (84-85).
다시 말해 중간계급(middle class)이라 자칭하는 이들과 이 시기 말경에 노동자계급(working class)이라 자칭하던 이들은 사뭇 다른 사람들이지만 공히 특권계급이나 유한계급과 대조적으로 '유용한 계급'이나 '생산계급'이라는 표현을 선택했다. 이러한 용법은 '하류, 중류, 상류'라는 또 다른 분류법과 묘하게 맞물리면서 중요하고도 혼란스러운 문제로 남아 있다 (89).
각각의 개인이 하나의 계급을 형성하는 것은 다른 계급에 맞서 공동의 투쟁 전선을 펼쳐야 할 때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봐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한편 계급 자체는 개개인을 초월한 독립된 존재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자신의 생활 조건이 미리 규정되었음을 발견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개인적 성장이 자신이 속한 계급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다.『독일 이데올로기』(95에서 재인용)
수백만 가정이 주어진 경제적 존재 조건 때문에 생활양식, 이해관계, 문화 등의 측면에서 여타 계급과 분리되어 적대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의 계급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자작농 간에 지역적인 연결이 부재한 탓에 서로의 이익이 일치할지라도 그들 사이에 어떠한 공동체나 전국적인 연합, 정치조직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어 18일』(95에서 재인용)
이처럼 이데올로기란 추상적인 동시에 허위적인 사유였고, … 진정한 물질적 조건과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서 언명되고 있다. … '환상, 허위의식, 비현실, 전도된 현실'이라는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들 속에서 도드라진다 (230-231).
생산의 경제적 조건에서 물질적인 변형과…… 인간이 이때의 모순을 인식하고 그것의 극복을 위해 투쟁할 때의 상태, 즉 법적, 정치적, 종교적, 미적, 철학적 형태, 요컨대 이데올로기적 형태와는 늘 구별해야 한다 (231-232에서 재인용).
사회주의가 프롤로테리아 계급투쟁의 이데올로기인 이상,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탄생, 전개, 강화라는 잘 알려진 조건하에 있다.『북방 연방에 보내는 서신』(232에서 재인용)
'쓰기 > 쓰기_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젝의 ‘공산주의’가 공허한 이유" vs. "지젝의 공산주의를 오독 말라" (0) | 2014.07.08 |
|---|---|
| 좌파란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2) (0) | 2013.05.09 |
| 긴 글 계획 (2013.04) (0) | 2013.04.28 |
| 라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 (0) | 2013.04.27 |
| 지젝과 영화 (0) | 2013.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