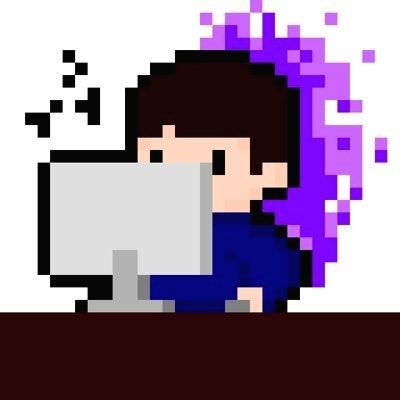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 Judith Butler
- Live
- Beyonce
- 정신분석학
- 화장품
- 북프리뷰
- ISA
- Whitney Houston
- Grammy
- Celine Dion
- Medley
- 권여선
- 발췌독
- 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 이소라
- 섹슈얼리티
- I Will Always Love You
- 유희열의 스케치북
- 윤희에게
- 라캉
- 김연수
- Althusser
- 그린비
- 북리뷰
- 페미니즘
- 들뢰즈
- 이상문학상
- 니체
- Adele
- 푸코
- Today
- Total
Acknowledgement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본문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 저자
- Althusser, Louis 지음
- 출판사
- New York | 2001-09-01 출간
- 카테고리
- 인문/사회
- 책소개
- The author presents his interpretat...
#북리뷰 & 피드백
알튀셰의 ISA 논문(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을 오늘 아침쯤에 다 읽었다. 사실 70% 이상 읽어놨었는데 휴가 나가면서 맥이 끊겨서 좀 오래 끓었다..ㅎ
저번 이 논문의 프리뷰에 올라왔던 댓글에 대한 피드백으로 이 논문에 대한 나의 감상을 정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듯 하야...허락은 안 받았지만 어차피 저번 글도 친구 공개였으니까..라고 생각하며 댓글의 내용을 옮겨보자면
"난 알튀세르에 대해 예전에 약간 공부한 적 있는데 그 논문과 Interpellation(이게 호명이라고 번역하면 되려나) 개념은 많이 유명하지. 근데 알튀세르는 인간을 너무 수동적인 퍼펫트로 몰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주체성과 따로 떼놓아볼 수 없다는 것까진 인정하겠지만 그것에 저항할 수도 없는 존재로 인간을 본 건 잘못이라고 봄
그리고 이 사람이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로 분류하는게 종교, 교육, 정치, 노조 뭐 이런건데 (내 기억이 맞다면) 그게 정말 ISA로 오늘날까지도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진 맑시스트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남기고 갑니다" (12월 8일).
1. 이데올로기의 편재성에 대해.
이 논문을 읽으면서 아주 강력한 알튀셰의 논거는 이데올로기의 은폐 기능을 재공식화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이데올로기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적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의 표현을 옮기자면 "[W]hat thus seems to take place outside ideology, ... in reality takes place in ideology" (그러므로 이데올로기 밖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기실 이데올로기 안에서 일어난다).
이는 매우 논박하기 어려운 논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라면서 아주 길게 반박해봤자 '그게 이데올로기의 효과라능ㅋ'이라는 한 마디로 반박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거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데올로기의 탈역사성(ideology has no history: 나는 이것을 이데올로기의 편재성ubiquity로 이해한다. 알튀셰 역시 omni-historic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을 반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의의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는 확실히 편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광의의 의미로 확장된 이데올로기에는 이데올로기만의 확고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있는가?
알튀셰, 그리고 그가 참고하는 "독일 이데올로기"/"공산당 선언"에서의 마르크스가 이데올로기의 핵심적 구성 요소를 무엇으로 두려는지는 (내가 읽기에는) 꽤 명확한데, 흔히 예상되는 대로 그것은 계급 투쟁history of class struggle인 것으로 보인다.
리토릭의 문제는 조금 제쳐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그런 문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 (자기)기만이지만, 다른 맥락에서, 혹은 다른 해석적 축을 도입시켜 같은 표현을 고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광의의 이데올로기가 사회 계급의 투쟁을 재생산하는 기구라는 점에 어느 정도 찬성한다. 예컨대 사상thought은 애초에 '보편적인 의견'이 되고자 하는 각축장으로부터 태어나지 않는가? (나는 광의의 이데올로기가 반드시 이데올로기로 불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현하고 싶다. 이는 사상, 주의, 관념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 번역 과정에서 계급 투쟁의 의미가 퇴색할 수는 있지만 다른 요소들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적 호명interpellation이 주체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확고한 주체라는 환상성 역시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며, 그것이 취하는 은폐의 기능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 역시 찬성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모든 존재를 확고한 존재로 호명하기만 하는가? 예컨대 비체abject의 논의에 대해 알튀셰가 자신 있게 답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크리스테바)? 혹은 이데올로기의 다중성multiplicity은 계급 투쟁이라는 단일성으로 언제나 귀결되어야 하는 운명에 쳐해 있는 것인가?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 사이에는 어떠한 흠과 틈도 없는가? 우리는 우리를 호명하는 이데올로기들 사이에서 알튀셰가 말한 것처럼 확고하게 그게 자기 자신임을 어떻게 보증하고, 또 어떻게 확신하는가?
나는 어떤 관념, 사상, 이데올로기가 주체를 포섭해내고, 포섭하는 과정에서 주체 형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주체의 부정을 생산하기 때문), 그것이 단일한 어떤 과정의 부분으로서, 혹은 보편적 과정의 다양한 변주만으로 파악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데올로기가 편재하더라도 (이는 이데올로기가 계급 투쟁이라는 축으로 환원되지 않을 때 가능할진데) '어떤'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것은 가능하다.
난 이것이 알튀셰가 어느 정도 예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는 지배계급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걷어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에 비해서는 국소적인 개혁이 용이하며, 이를 통해 개혁된 이데올로기가 이전의 이데올로기와 같지 않으리라고 말하고 싶은 것. (이 지점에서 나의 참조점은 헤겔과 라클라우다)
2. 현대적 의미의 ISA
이 부분은 사실 자세히 다루기보단 알튀셰의 논문 내부에서 답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내 식대로 정리하자면: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는 시대에 따라 바뀐다. 예컨대 종교/가족의 중세적 ISA는 근대로 이행하며 다양한 ISA들로 분화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재생산과 이데올로기 내면화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ISA로서 학교는 알튀셰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적어도 학교/교육이 가진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기능을 인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동시에 학교/교육에는 전복적 기능도 있는데, 바로 알튀셰와 같은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기관이 학교이기 때문이다. (사실 난 이 부분에서 알튀셰의 오만을 읽기도 하는데, 과연 그가 일반적인 학교와 그랑제꼴을 구분하지 않고 생각했을까?)
어떤 ISA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퇴색하고 다른 ISA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도 한다. 알튀셰가 명확히 답변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변용 속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유지에 필요한) 특정 '기능'이 분화되거나 강조된다.
다만, 어떤 것이 그것이 ISA적 기능을 띄고 있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SA(국가 기구)에 봉헌하는 ISA와 그렇지 않은 ISA 간에 뚜렷한 경계가 있는가? 나는 이 모호한 '경계선'이 특정 이데올로기를 허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요약하자면
1. 이데올로기의 불가역성: 그렇게 확장시켜 생각할 거면 아닌 게 어딨음? 일단 맞다 치더라도 이데올로기의 내부적 전복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진 않음.
2. 구체적인 ISA는 변화함. 근데 그게 그건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임.
3. 이건 본문에 안 썼으니까 ps: mirror recognition이라는 표현에서 알튀셰가 분명히 초기/중기 라캉을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그렇다면 알튀셰의 의견은 실재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가열차게 깔 수도, 혹은 이데올로기를 실재의 위치에 올려놓아 아주 강력하게 변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 지젝은 후자를 택하고 있다는 것 또한 나의 의견...전자는 굳이 해보고 싶지 않은데 이와 유사한 작업이 라클라우의 '적대' 개념인 것 같고...뭐 그냥 주관적 독해입니다.
암튼 잘 읽었습니당.
'읽기 > 읽기_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혁명을 기도하라> 서평 (0) | 2013.04.25 |
|---|---|
| 2008년도/2009년도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0) | 2013.04.25 |
| 딜도가 우리 가정을 지켜줬어요 (0) | 2013.04.25 |
| 카발라: 유대교 신비주의 (0) | 2013.04.25 |
| <이상문학상 작품집> 감상 (0) | 201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