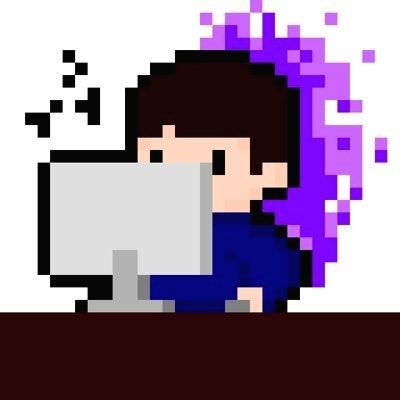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 ISA
- 권여선
- 이소라
- Judith Butler
- Whitney Houston
- Althusser
- 화장품
- Live
- 김연수
- 발췌독
- 이상문학상
- 북리뷰
- 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 정신분석학
- 섹슈얼리티
- 그린비
- Adele
- 페미니즘
- Medley
- Celine Dion
- 유희열의 스케치북
- 라캉
- 들뢰즈
- 푸코
- 니체
- Beyonce
- I Will Always Love You
- 북프리뷰
- 윤희에게
- Grammy
- Today
- Total
Acknowledgement
섹슈얼리티와 정치: 본질주의와 구성주의 본문
-섹슈얼리티와 정치
섹스/젠더/섹슈얼리티에 있어서 본질주의와 구성주의의 문제를 짚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난 이 글에서 본질주의와 구성주의의 의미를 모두 섹스/젠더/섹슈얼리티에 관련된 의미, 곧 성 정치학에 관련된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먼저, 성에 본질을 상정하는 입장은 초기 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전에 여성은 어떠한 '특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정치적 분야에 기용되어서는 안 된다. 혹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공직의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여성의 능력을 폄하하는데 주로 이용돼 왔던 리토릭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이 본질을 중시하는 것은 하나의 구심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컨대 급진주의 페미니스트 중 일부는 여성적 특질을 (이러한 용어가 허용된다면) 특권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여성과 남성의 좁힐 수 없는 차이로 만들고 그 차이의 지점에 서서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한다.
예컨대 모성에 대한 옹호가 그러하다. 여성의 모성을 남성으로선 알 수 없는 여성적인 특권이며 그러한 권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생활적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경향상 성의 본질주의를 허용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
다만, 본질주의는 필연적으로 남녀의 성차를 강화하는 구도로 전개되어 왔고 그 결과 (가장 대표적인 것만 꼽자면) 두 가지 위험을 잉태하게 되었다. 하나는 본질주의적 레토릭이 이전에 여성을 억압했던 식으로 전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성별 이분법주의에 빠져 성과 성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정체성(트랜스섹슈얼 및 트랜스젠더) 및 새롭게 대두되는 성별 이분법주의 바깥에 있는 정체성(무성애자 및 범성애자 등)을 자신들의 틀 내에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시에 섹스/젠더/섹슈얼리티가 사회적/문화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구성주의의 주장은 본질주의적 입장과 꼭 반대의 이점과 약점을 갖고 있다. "우리들의 섹스/젠더/섹슈얼리티에 본질을 상정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 것인가?" 결국 페미니즘에서는 구성주의적 입장들마저도 대개 섹스를 어느 정도는 본질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도 한다(이에 대해서는 이전 내 다이어리에서 엘리자베스 그로츠에 대한 반박을 참조할 것).
이 부분에 있어 이 문제를 끝까지 몰고 가, 젠더뿐만 아니라 섹스 및 섹슈얼리티도 구성적 현실이란 것을 강조한 학자가 주디스 버틀러이다. 내가 버틀러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구도가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기도 하면서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꺼두지 않는 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섹스나 젠더 모두 담론에 의해 구성되지만 그 구성된 것이 우리가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현실이며, 그녀 스스로 말하듯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Here is 'a' person)은 중요하다. 동시에 담론 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보다 정확히는 담론에 포착되지 않는 영역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가까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담론의 메타렙시스(Metalepsis is a figure of speech in which one thing is referred to by something else that is only remotely associated with it. Often the association works through a different figure of speech, or through a chain of cause and effect. Often metalepsis refers to the combination of several figures of speech into an altogether new one. Those base figures of speech can be literary references, resulting in a sophisticated form of allusion.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옴. 메타렙시스란 수사법/비유법의 하나다. ... 종종 메타렙시스란 몇 가지 비유법의 결합이 하나의 새로운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르기도 한다. 이 구절만 이해하면 큰 문제는 없을 듯)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지배적 담론의 전복을 꾀한다. 내가 이해하기에 버틀러가 메타렙시스라는 용어를 이용하는 방식은 이렇다; 우리를 구성하는 담론은 하나가 아니며 그 담론이 겹치는 지점을 통해서 전복의 가능성을 꾀할 수 있다는 것.
일단 여기까지의 개괄적인 설명 중 다시 나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섹스/젠더/섹슈얼리티는 구성적이다.
-담론/언어의 권력은 (푸코의 용법에서처럼) 강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복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이론적인 개괄이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텐데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인 동성 결혼과 동성 커플의 입양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 사례로 선정해서 글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그 구체적 사례에서 추론해 낸 원래들을 이용해 보다 일반적인 이야기로 글을 마무리하고 싶다.
먼저 동성 결혼에 대한 입장은 이전에 다른 기회를 통해 말했듯이 반대, 적어도 도입에 있어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동성 결혼이 첫째로는 동성애를 보다 본질주의적 실체로 상정할 위험이 있다는 것, 둘째로는 다른 비이성애 그룹과의 단절을 전제로 하고 동성애를 이성애의 담론 속으로 포섭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논거가 내 생각엔 보다 중요하며 이를 설명함으로써 첫 번째 논거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애초에 결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이란 제도가 여러가지 경제적, 사회적 특권을 상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세법에서의 이익, 주변의 인정, 함께 살아도 이상하지 않은 사이로의 발전 등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결혼을 통해서만 승인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혼 제도는 이성애 중심주의에 기반하여 주조되어 있으며 성 역할의 분리 및 가부장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 등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표출하고 있다. 이 제도에 포섭되는 것은 기존의 문제틀을 수정하지 않고 편의주의적으로 영합하는 시도 이상일 수 있는가?
동성 결혼에 대한 논쟁은 인간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vs. 그들은 그런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 의 구도로 고착화되어 있고 결국 권리의 연원을 질문하는 더 중요한 활동에 몰두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한 권리를 별 질문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이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는 그러한 권리가 있지만 다른 섹슈얼리티들에게는 아직도 그러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수자에서 일반적 인권을 담지하는 '존재'로 격상된 동성애자 그룹은 적어도 사회적으로 하나의 실재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구정하는 심리적, 사회적, 자아정체적 과정은 모두 무시되는 것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적어도 결혼 제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러한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재사유가 필요하며 적어도 동성애 그룹을 포섭함으로써 그 제도의 균열을 일으키고 최종적으로 다른 비이성애 그룹에게 그러한 권리가 이양, 양도될 수 있는 방식으로, 라는 조건이 붙은 하에서 나는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동성 커플의 입양 문제는 여기에 한 가지 축을 더 설정하는 것일텐데, 아이의 인권과 삶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혼 제도가 결과적으로 가족을 이루기 위한 전제이고 근대적 의미에서의 가족이 아이를 가짐으로써 성취된다고 할 때, 아이의 존재 역시 동성애자들에겐 '인정'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은 결혼에 대해서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입양 권리에 대한 승인(이러한 표현은 매우 웃긴 것인데 인간의 권리를 승인하는 인간은 도대체 누구라는 것인가?) 역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내린 후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다만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개인차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 될 텐데 그렇다면 결혼/입양을 과도기적 차원에서 받아들임으로써 개인이 받는 고통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다.
결혼이든 혹은 다른 제도(예컨대 프랑스의 결연PACS 제도)든 결국 양자의 결합에 대한 승인이 (지배적으로) 결혼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사회라면 결혼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과도기적 시기에 개인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를 위협받을 수도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할 수도 있다.
또한 아이들 역시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개인의 고통을 알고서도 그들의 결합/가족 구성을 발전적 체계의 일환으로, 균열의 조짐으로 수용해야 하는가? 더 큰 목적(대의)이 있기 때문에 보다 작은 개인의 고통은 무시될 수 있는가?
나는 이 문제를 대의와 그에 대한 희생의 구도로 보기 이전에 조금 더 다른 구도, 개인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고통이 값진 것이기에 그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는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쉬운 성인들의 결합은 이러한 질문에서 보다 자유로운 편이다.
그렇지만 아이에 관해서는 어떠한가? 이 문제는 또 다른 큰 문제, 곧 입양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이어질 수 있을진데 당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쓰기 > 쓰기_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라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 (0) | 2013.04.27 |
|---|---|
| 지젝과 영화 (0) | 2013.04.27 |
| 좋은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 (폴라 비가운의 기준) (0) | 2013.04.25 |
| 인간은 왜 인간이 만든 것을 염려하는가? (0) | 2013.04.25 |
| 연애에 대한 단상 (0) | 2013.04.25 |